- 유형
- 단체
- 분류
- 사회운동
- 동의어
- 정의구현사제단
- 유사어/별칭/이칭
- 정구사
- 영어표기
-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CPAJ)
- 한자표기
- 天主敎正義具現全國司祭團
- 결성일
- 1974년 9월 26일
- 시대
- 박정희정권기 ‣ 유신체제 전기 ‣ 긴급조치1-4호기 민주화운동
- 지역
- 서울, 원주 등

1974년 7월 23일 지학순주교양심선언을 계기로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정권에 맞서 한국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천주교 사제들의 단체이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천주교회가 현대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적응(현대화, aggiornamento)해나갈 수 있는 여러 신학적 교의(dogma)들을 결정했다. 특히 공의회는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을 통해, 천주교회가 ‘세상 속 교회’로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천주교회가 성속이원론과 개선주의(triumphalism)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보여 왔던 폐쇄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천주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 천주교회는 공의회의 결정사항들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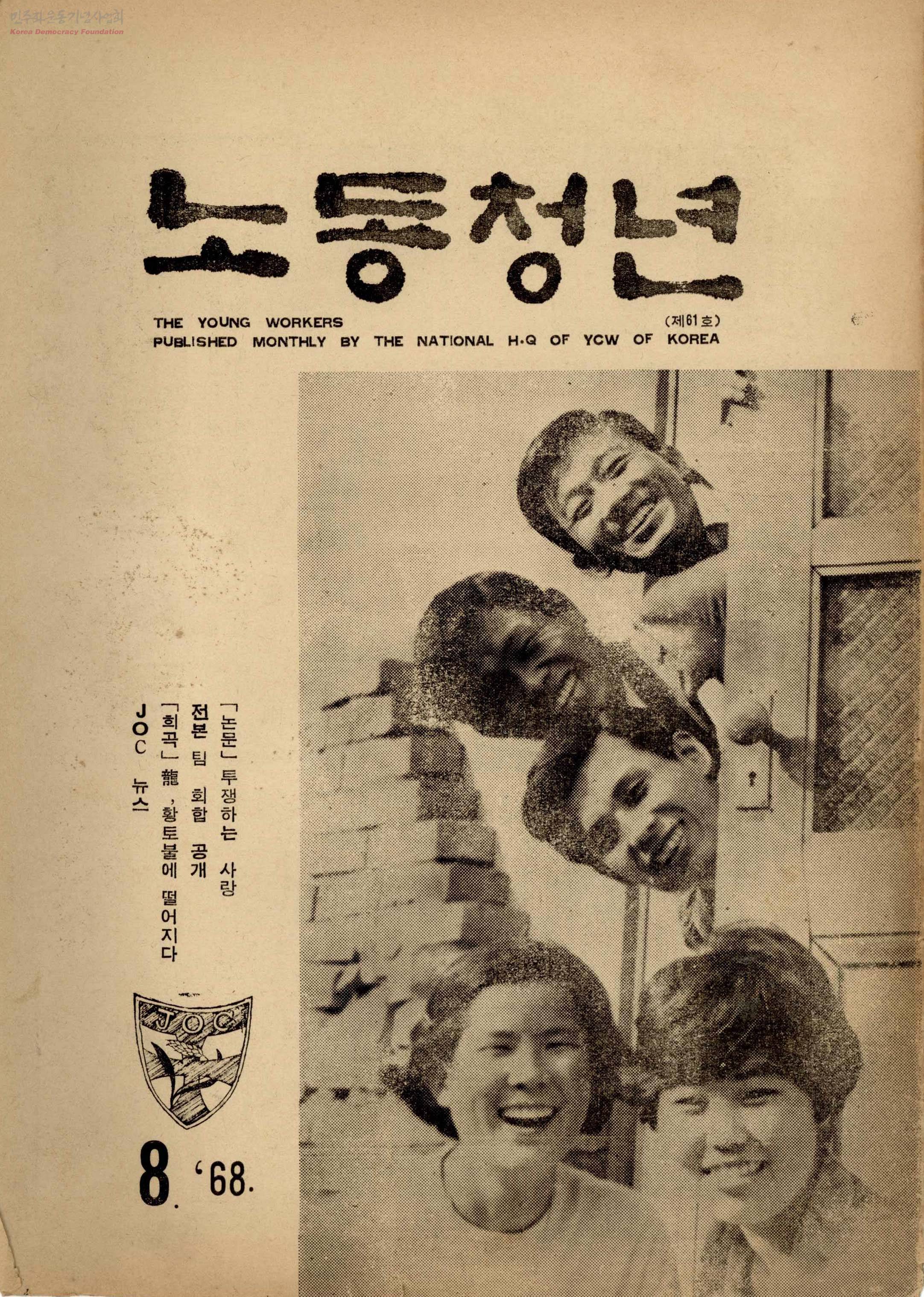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추진하기 시작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됐다. 급격한 산업화는 한국 사회 안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오고 있었고, 특히 노동집약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톨릭노동청년회(JOC)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측들의 반발을 불러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강화도심도직물사건’(1967-1968)이었다. 강화도 심도직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가운데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사측은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지원한 강화도성당 전 미카엘(Michael Bransfield) 신부를 협박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천주교회는 사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1968년 2월 9일 자로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공의회 이후 발표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사회교리 문건이다.
한편 장기 집권을 도모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9월에 삼선개헌안을 통과시키고 1971년에 다시 대통령이 됐다. 이어서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공포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지도자가 김수환(金壽煥) 추기경과 지학순(池學淳) 주교였다. 이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를 ‘세상 속 교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지학순 주교는 1965년에 천주교 원주교구장에 임명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와 유신체제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1년 10월에 원주 시내에서 있었던 사회 정의 구현과 부정부패 규탄대회였다. 지학순 주교는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주지역 내에 방송국을 설립하길 원했다. 이에 원주교구는 1970년에 5.16장학회와 공동 출자해 원주방송주식회사(원주MBC)를 설립했다. 그런데 방송국은 부패가 만연했으며, 지학순 주교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지학순 주교를 비롯한 원주교구 신자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게 됐다. 그것은 5.16장학회의 실질적 소유자인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았다. 지학순 주교는 이밖에도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총재주교(1972), 국제엠네스티 한국위원회 명예회장(1972) 및 이사장(1973), 한국노동교육협의회 회장(1973)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직책을 맡으면서 박정희 정권과 대립하고 있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의 직접적인 발단은 1974년 7월 6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던 지학순 주교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연행되면서 시작되었다. 민청학련사건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던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한 사건인데, 지학순 주교가 그들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연행되었다. 지학순 주교는 7월 10일에 서울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연금됐다가 성모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상군법회의는 지학순 주교에게 7월 23일 오전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학순 주교는 바로 그날 명동성당 성모동굴 앞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양심선언을 했다.(지학순주교양심선언) 이 일을 계기로 지학순 주교는 다시 연행됐고, 1974년 8월 12일 재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직 교구장 주교를 구속한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회에 상당한 충격이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74년 8월 6일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지학순 주교의 무고를 밝히는 결의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일치된 입장을 대외에 천명했다. 이후 문제의 심각성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 전국의 많은 사제들이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각 교구를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열었다. 예를 들어 8월 12일 오후 6시에는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지학순 주교와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미사와 철야 기도회가 열렸다. 이 기도회에는 서울, 인천, 원주, 춘천, 부산, 마산교구 사제 40여 명과 수녀 약 700여 명, 신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8월 26일에는 인천교구 주교좌 답동성당에서 지학순 주교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이 기도회에 모인 사제들은 ‘우리의 주장’이라는 청원서를 채택했다. 이 청원서에는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에 대한 적극 지지,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 즉각 해제와 투옥 중인 지학순 주교를 비롯한 목사, 교수, 변호사, 학생들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 민주주의 회복과 인간 존엄,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회를 지속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속적으로 기도회가 열리자 사제들은 조직과 운영 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1974년 8월에 이 조직의 대표로 박상래(朴相來) 신부, 총무로 함세웅(咸世雄) 신부를 선임했다. 한편 1974년 9월 24일에는 원주교구 주교좌 원동성당에서 기도회가 열렸다. 이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사제는 300여 명가량 됐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과 천주교회의 사회교리(social doctrine)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사제단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랜 토의를 거쳐 사제단의 명칭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으로 결정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한국순교복자대축일인 9월 26일에 명동성당에서 민주 회복,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기도회 가운데 봉헌된 미사는 대전교구장 황민성(黄旼性) 주교가 주례했다. 이 기도회에서 사제단은 “경제제일주의에 항의하는 ‘제1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 당시 사제단 가입원서에 서명한 사제는 5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한국 천주교회 전체 사제의 약 60%에 달하는 숫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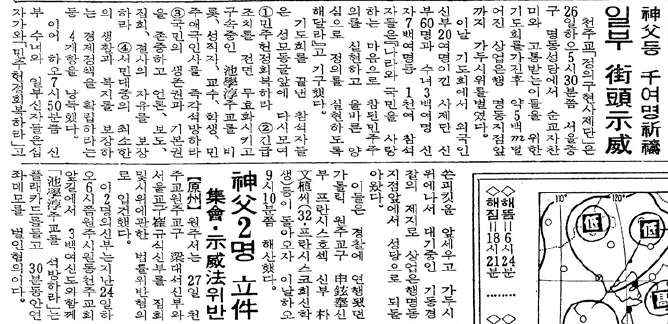
이어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74년 10월 9일경 가톨릭대 신학부(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열린 전국 성년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시위로 이끌었다. 당시 전국 성년대회는 주교와 사제, 수도자 등 800여 명과 2만여 명의 평신도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미사와 참회 예식, 성체 현시와 거동, 성년 특별은사 선포식이 끝나고 퇴장 행렬이 시작되자, 사제단 신부들은 행렬의 방향을 학교 정문으로 돌려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이때 전주교구장 김재덕(金在德) 주교, 인천교구장 나길모(羅吉謨) 주교, 안동교구장 두봉(René Dupont) 주교, 춘천교구장 박 토마(Thomas Stewart) 주교, 대전교구장 황민성 주교 등 다수의 주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처럼 새롭게 창립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행보는 한국 교회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한국 교회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사제단은 1974년 11월 6일에 명동성당에서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다시 열었다. 이날 기도회에는 사제, 수도자 200여 명과 신자 1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박정희 정부정권은 명동성당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차단하는 등 기도회를 방해했다. 이 자리에서 사제단은 “국민의 긍지를 찾기 위한 ‘제2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제단은 11월 20일에도 명동성당에서 기도회를 열어, “새 질서 마련을 위한 ‘제3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나아가 사제단은 11월 27일경 종교, 언론, 학계 인사들이 모여 조직한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하여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갔다. 또한 1975년 2월 6일에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약 4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제단은 이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4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처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중심이 되어 개최된 기도회는 민주화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불러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1975년 2월 17일경 지학순 주교를 석방했다. 다음날인 2월 18일에 사제단이 주관하는 지학순 주교 석방 환영 미사가 명동성당에서 봉헌됐다. 이날 미사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광주대교구장 윤공희(尹恭熙) 대주교 등 사제, 수도자 300여 명과 신자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론을 맡은 지학순 주교는 부도덕을 질책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75년 2월 24일 제임스 시노트(James Sinnott, 진필세) 신부와 함께 ‘인혁당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인혁당사건(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사제단 소속 함세웅, 김승훈(金勝勲), 문정현(文正鉉), 신현봉(申鉉奉) 등 일부 성직자들은 1976년 3월 1일에 명동성당에서 윤보선(尹潽善)과 김대중(金大中) 등 유력 재야 정치인, 개신교 목사, 교수 등과 함께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에도 참여하였다(3.1민주구국선언). 박정희 정권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연행했고, 이로 인해 사제단 소속 사제들이 구속,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1977년 3월 22일에 열린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함세웅, 신현봉, 문정현, 김승훈, 장덕필(張德弼) 신부에게 내려진 실형을 확정했다.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몰락했으나, 12.12군사반란으로 전두환(全斗煥) 정권이 들어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1982년 4월에 벌어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를 숨겨준 혐의로 원주교구 최기식(崔基植) 신부가 구속되자, 천주교 교구들은 이를 규탄하며 최기식 신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성명서들을 발표했다. 사제단 역시 6월 14일에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1985년 6월 8일에도 같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조사와 피해 보상, 1985년 5월에 벌어진 서울미문화원농성사건과 1982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정당한 평가, 국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구속된 이들의 석방과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

1987년 1월 14일에 박종철(朴鍾哲)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자(박종철고문치사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또한 1월 24일에 ‘고문살인의 종식을 위한 우리의 선언’을 발표하여 박종철이 사망하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고문 책임자의 엄단과 고문수사기관 해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5월 18일에 명동성당에서 열린 ‘광주사태 7주기 추모미사’ 후, 사제단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은폐, 조작됐다는 사제단의 폭로는 6월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6월 10일 사제단은 “‘6.10 국민대회’에 적극 동참하며”라는 선언문을 통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6.10국민대회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다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80년대 후반부터 통일운동에 매진했다. 특히 사제단 소속인 문규현(文奎鉉) 신부가 1989년 6월에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방북했는데, 그는 6월 6일에 평양 장충성당에서 북한 신자들과 함께 ‘통일 염원 미사’를 봉헌했다. 사제단도 같은 시각에 임진각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에서 동시에 미사가 봉헌된 것이었다. 문규현 신부는 사제단 대표로 같은해 7월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그것은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참가한 임수경(林秀卿)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기 위한 방북이었다. 사제단은 7월 22일경 임수경의 안전한 귀환을 돕기 위해 문규현 신부가 방북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이로 인해 3명의 사제들이 구속됐고, 8월 15일경 임수경과 함께 판문점을 넘어 귀환한 문규현 신부도 함께 구속됐다(문규현신부방북사건). 이를 계기로 사제단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002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운동, 2003년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운동,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2007년에는 김용철(金勇澈) 변호사를 도와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는 등 사회 부조리 타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게이트사건(국정농단사건)이 불거지자 사제단은 각 교구에서 ‘박근혜 퇴진과 민주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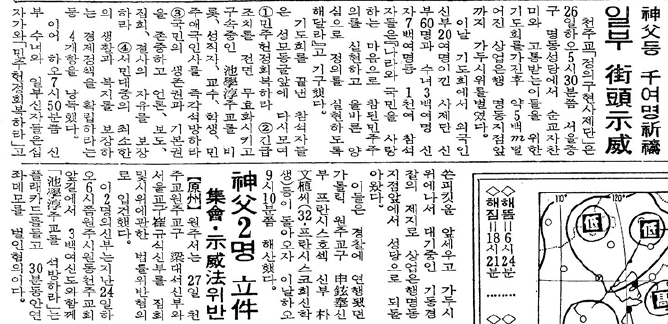









본 자료의 경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제4유형을 적용하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연계자료의 경우 해당기관 또는 사이트의 저작권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저작권 정책 자세히 보기 ]
